[좌정묵의 하루를 시작하며] 한마디 덕담(德談)을 위하여
- 입력 : 2025. 02.12(수) 03:3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2005년, 꼭 20년 전 서울 강남의 한 학원에서 대입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논술을 강의했었다. 주로 재수생들이었기에 대입 문제에 절박했는데 지방의 학원들과는 달리 서울의 경우, 강사들은 물론이고 수험생들의 자세가 무서울 정도로 진지했다. 아직도 그때의 제자들은 1년 정도의 인연이었을 뿐인데 지금까지도 안부를 물어 온다. 새해가 되면서 SNS로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메시지는 한결같이 상투적이다. 그런데 설날 아침 한 제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생각이 깊어지고 말았다.
그때의 수험생들이 이제 곧 마흔을 넘기고 있거나 많아야 마흔 중반 정도일 뿐이다. '더 귀 기울이고 생각을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오래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말에 참으로 부끄러웠지만, '고맙다'라는 짧은 한마디로 답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마흔을 넘기고는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했다면 이제 겨우 십 년 남짓일 뿐이다. 메시지 내용이 상투적이지 않아 혹시 하는 마음에 삶의 방향이 정치 쪽인가 우려하며 묻는데 그냥 웃기만 하면서 또 '오래 지켜봐 달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날 '귀 밝아라, 눈 밝아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는 기원(祈願)의 의미였으리라. 그리고 아침에 오곡밥을 함께 먹으면서 어른들은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이 술이 '귀밝이술'이다. 한자어로는 명이주(明耳酒), 치롱주(治聾酒)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민속백과사전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귀밝이술'의 유래에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는 없었다. 그렇다고 대보름날 차가운 청주 한 잔 마신다고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합리적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도 참 낭만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하필이면 왜 덕담이 '귀 밝아라, 눈 밝아라'였을까. 겨울이 지나는 싸늘한 계절에 어둠을 밝히는 달이므로 보름달처럼 눈이 밝아지는 일은 유감주술(類感呪術)의 의미로 그 유래를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귀 밝아라'는 보름달과 무슨 상관일까. 단순히 기능적인 면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성인(聖人)'을 파자하면 '이(耳)+정(呈)+인(人)'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귀가 드러난 사람', 즉 '귀가 밝은 사람'이다. 하늘과 땅의 소리며 기운을 모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공자와 맹자가 궁극적으로 여긴 이상적 인간상이 성인(聖人)이지 않은가.
보름달은 기원의 대상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들어줌의 대상이다. 어떤 목소리도 들어주고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도 찾아서 들어주는 대상이다. 너그러움이기도 하고 넉넉함이다. 자연을 늘 경원시했던 우리 민족에게 '귀 밝아라, 눈 밝아라'의 덕담은 지극한 삶의 깨달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제자가 전해온 말들을 오래 생각하며 그래도 참 고맙다. 오늘, 정월대보름을 맞아 제주의 하늘은 몹시도 싸늘하다. 비록 흐리더라도 저녁이 되면 하늘을 우러러 그 보름달을 그려보며 '귀 밝아라, 눈 밝아라'고 주문이라도 걸어봐야겠다. <좌정묵 시인·문학평론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그때의 수험생들이 이제 곧 마흔을 넘기고 있거나 많아야 마흔 중반 정도일 뿐이다. '더 귀 기울이고 생각을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오래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말에 참으로 부끄러웠지만, '고맙다'라는 짧은 한마디로 답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마흔을 넘기고는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했다면 이제 겨우 십 년 남짓일 뿐이다. 메시지 내용이 상투적이지 않아 혹시 하는 마음에 삶의 방향이 정치 쪽인가 우려하며 묻는데 그냥 웃기만 하면서 또 '오래 지켜봐 달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다. 우리 선조들은 이날 '귀 밝아라, 눈 밝아라'는 덕담을 건넸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는 기원(祈願)의 의미였으리라. 그리고 아침에 오곡밥을 함께 먹으면서 어른들은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이 술이 '귀밝이술'이다. 한자어로는 명이주(明耳酒), 치롱주(治聾酒)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민속백과사전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귀밝이술'의 유래에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는 없었다. 그렇다고 대보름날 차가운 청주 한 잔 마신다고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진다는 합리적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도 참 낭만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하필이면 왜 덕담이 '귀 밝아라, 눈 밝아라'였을까. 겨울이 지나는 싸늘한 계절에 어둠을 밝히는 달이므로 보름달처럼 눈이 밝아지는 일은 유감주술(類感呪術)의 의미로 그 유래를 짐작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귀 밝아라'는 보름달과 무슨 상관일까. 단순히 기능적인 면만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성인(聖人)'을 파자하면 '이(耳)+정(呈)+인(人)'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귀가 드러난 사람', 즉 '귀가 밝은 사람'이다. 하늘과 땅의 소리며 기운을 모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공자와 맹자가 궁극적으로 여긴 이상적 인간상이 성인(聖人)이지 않은가.
보름달은 기원의 대상으로 우리 민족에게는 들어줌의 대상이다. 어떤 목소리도 들어주고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도 찾아서 들어주는 대상이다. 너그러움이기도 하고 넉넉함이다. 자연을 늘 경원시했던 우리 민족에게 '귀 밝아라, 눈 밝아라'의 덕담은 지극한 삶의 깨달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제자가 전해온 말들을 오래 생각하며 그래도 참 고맙다. 오늘, 정월대보름을 맞아 제주의 하늘은 몹시도 싸늘하다. 비록 흐리더라도 저녁이 되면 하늘을 우러러 그 보름달을 그려보며 '귀 밝아라, 눈 밝아라'고 주문이라도 걸어봐야겠다. <좌정묵 시인·문학평론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존폐 논란' 제주 차고지 증명 제외 대상 18만대 VS 31만대
- 2

'4·5일장 증가' 제주 양지공원 화장로 운영 늘린다
- 3

[고용현의 한라칼럼] 제주도 도시계획의 기초체력에 대한 논…
- 4

'서울대 입학'에도 등록금 없어 웃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
- 5

오영훈 제주지사 일행 리조트 제공 식사비 결제 불송치
- 6

[양건의 문화광장] 혼돈의 시대,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위안을…
- 7

제주4·3유족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업체 추가
- 8

제주 읍면동 절반 인구감소위험 지역… "맞춤형 전략을"
- 9

제주 만감류 산업 새로운 도약.... 만감류연합회 출범
- 10

올해 제주 공립 중등교사 90명 최종 합격
- 03:30

[오수정의 목요담론] 원도심에서의 시작
- 03:00

[열린마당] 하수도 정책에 대한 손톱 밑 가시 뽑…
- 02:00

[열린마당] 반려견과 함께 놀자! 서귀포시 고향…
- 02:30

[오윤정의 한라시론] 기후위기시대 사회복지분…
- 01:30

[열린마당] 겨울철 조경수 관리
- 07:00

[신재경의 건강&생활] 뱀 독에서 탄생한 고혈압…
- 06:30

[열린마당]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 06:00

[열린마당] 기후변화 시대, 침수 대응을 위한 우…
- 03:30

[좌정묵의 하루를 시작하며] 한마디 덕담(德談)…
- 01:00

[열린마당] 청렴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나부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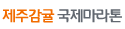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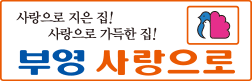






 2025.02.12(수) 22:27
2025.02.12(수) 2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