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정의 한라시론] 저출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입력 : 2025. 04.17(목) 02: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최근 필자의 주요 관심분야는 저출생과 사회복지분야 균형발전이다. 전세계적으로 출산과 관련한 주요지표로 합계출산율을 이용해 대체출산율과 초저출산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체출산율은 합계출산율 2.1명,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을 기록하며 40년 전부터 대체출산율을 밑돌았고, 2002년에는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해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했다. 이후 인구감소의 충격 속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약 20년간 30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끝없이 하락했다.
지난 2월 통계청은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발표했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일 때 미국 뉴욕타임즈는 "중세 흑사병보다 더한 인구 감소"라고 평가했는데, 다행히 2024년 합계출산율(0.75명)은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하다가 소폭 반등했다. 어떤 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저출산정책 해외사례연구(KDI, 2024)에 따르면 OECD 대부분 국가들이 2011년 대비 2021년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으나 독일·스웨덴·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저출생 경험 후 다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고, 현재 1.5명~1.8명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통합적 가족지원 정책 방향 수립 ▷수당 지원 정책보다는 보육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 출산 관련 서비스 지원 중심의 재정지출 방향으로 전환 ▷육아휴직 및 기업 참여 활성화 ▷연속성 있는 보육 지원 ▷가족 개념 재정립 ▷주양육자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여기서 '수당 지원 정책보다는 보육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 출산 관련 서비스 지원 중심의 재정지출 방향으로 전환'은 사회복지분야 균형발전과 연계된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균형발전은 기존 인프라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접근성 중심으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이 과거 사회서비스 관련 시설의 인프라 확충에서 서비스 위주의 공급 확대·접근성 개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수도권외 지역의 인구 유출 및 저출생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관련 인프라의 확충보다는 서비스의 공급 확대 및 접근성 개선, 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4차산업 이상의 디지털 혁신시대에 살고 있다. AI 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면서 AI가 일자리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대체출산율과 초저출산국가에 대한 기준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의 가치, 저출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 합계출산율 2.06명을 기록하며 40년 전부터 대체출산율을 밑돌았고, 2002년에는 합계출산율 1.18명을 기록해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했다. 이후 인구감소의 충격 속에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약 20년간 30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끝없이 하락했다.
지난 2월 통계청은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발표했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일 때 미국 뉴욕타임즈는 "중세 흑사병보다 더한 인구 감소"라고 평가했는데, 다행히 2024년 합계출산율(0.75명)은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하다가 소폭 반등했다. 어떤 요인이 작용한 것일까?
저출산정책 해외사례연구(KDI, 2024)에 따르면 OECD 대부분 국가들이 2011년 대비 2021년 합계출산율이 하락했으나 독일·스웨덴·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은 저출생 경험 후 다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고, 현재 1.5명~1.8명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통합적 가족지원 정책 방향 수립 ▷수당 지원 정책보다는 보육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 출산 관련 서비스 지원 중심의 재정지출 방향으로 전환 ▷육아휴직 및 기업 참여 활성화 ▷연속성 있는 보육 지원 ▷가족 개념 재정립 ▷주양육자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등이다.
여기서 '수당 지원 정책보다는 보육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 출산 관련 서비스 지원 중심의 재정지출 방향으로 전환'은 사회복지분야 균형발전과 연계된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균형발전은 기존 인프라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접근성 중심으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즉 사회보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지원 필요성이 과거 사회서비스 관련 시설의 인프라 확충에서 서비스 위주의 공급 확대·접근성 개선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수도권외 지역의 인구 유출 및 저출생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에서 관련 인프라의 확충보다는 서비스의 공급 확대 및 접근성 개선, 육아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4차산업 이상의 디지털 혁신시대에 살고 있다. AI 기술이 초고속으로 발전하면서 AI가 일자리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대체출산율과 초저출산국가에 대한 기준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의 가치, 저출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단독] 제주해바라기센터 공금횡령 의혹… 경찰 수사
- 2

'스포츠로 하나된 제주' 제59회 도민체육대회 18일 개막
- 3

제주 아파트 25층까지 가능… 건축규제 대폭 완화
- 4

'재건축' 제주동부경찰서 예산 부족 완공 1~2년 늦어진다
- 5

오영훈 제주도정 출범 후 관주도 행사 예산 펑펑?
- 6

제주서 하루 만에 절단사고 4건... 의료진 부족으로 도외 전…
- 7

[이호진의 목요담론]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조심해야
- 8

지하수연구 통·폐합 ..'기후위기시대' 거꾸로 가는 제주도정
- 9
[사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논의만 하다 날 샐라
- 10

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 현장서 펌프카 전도 1명 사망
- 00:40

[열린마당] 전동가위, 편리함 뒤에 숨겨진 위험
- 00:20

[열린마당] 불행의 씨앗 음주운전, 당신의 인생…
- 00:00

[열린마당] 청렴 감수성이란?
- 02:00

[오윤정의 한라시론] 저출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
- 02:30

[열린마당] 맑은 물처럼 청렴한 행정을 다짐하며
- 06:00

[이호진의 목요담론]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조심…
- 01:30

[열린마당] 제1회 제주도장애인체육대회를 마치…
- 01:00

[열린마당] 봄철 고사리 산행, 즐겁지만 안전이 …
- 03:00

[신재경의 건강&생활] '폭싹 속았수다' 그 따뜻한…
- 02:30

[열린마당] 제주 바다를 지키는 작은 실천, 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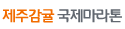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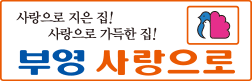






 2025.04.19(토) 11:24
2025.04.19(토) 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