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觀] 폭싹 속았수다
장하다는 말
- 입력 : 2025. 03.31(월) 03:3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한 장면.
[한라일보] 삶은 누구에게나 고되기 마련이라 타인의 삶, 그 무게를 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누구나의 행복에도 슬픔이 곁들여져 있을 것이고 기쁨의 한 켠에 드리운 남의 그늘에 들어서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빛나는 남의 파편을 줍는 일은 바닷가의 조개 껍질을 줍는 일과는 다르다. 그 파편의 조각을 기어코 줍고 갈아서 비수로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한 미움의 시대,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자주 잠깐 슬쩍 보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러한 '숏츠'와 '클립'의 세상 속에서, 간파와 오독의 흐름 속에서 타인을 이해한다는 일을 정녕 요원한 일일까. 나와 다를 수 밖에 없는 남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은 영영 과거로 사라져 버린 걸까.
임상춘 작가가 쓰고 김원석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의 16부작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는 이 위험한 시대에 한숨처럼 뱉게 되는 허망한 질문들에 대한 간곡한 대답이다. 1960년대부터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을 제주와 부산, 서울이라는 공간을 넘나들며 펼쳐 놓은 [폭싹 속았수다]의 이야기는 고색창연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삶의 순환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이들, 사랑을 하고 어른이 되는 순간들, 좌절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끝끝내와 기어코를 지나 마침내로 향하는 여정이 펼쳐진다. 이야기의 축은 제주에서 나고 자란 요망진 반항아 오애순(아이유)과 팔불출 무쇠 양관식(박보검)의 사랑 이야기다. 애순을 수시로 찾아오는 가난과 불운이 그의 삶을 불행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칠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한 사람,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이 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꿈 꿔보지 못한 삶의 끝을 만들게 해준 사람이 바로 관식이다. [폭싹 속았수다]는 엄마(광례,염혜란)라는 아랫목이 너무 일찍 차가워진 한 사람의 곁에 또 다른 아랫목인 나무 관식을 세우는 애틋한 로맨스 판타지인 동시에 가족이라는 집단의 힘을 긍정하는 휴먼 드라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일이 생의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는 이 드라마가 지금 시대의 대중들에게 일정 부분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점은 분명하다. 작품을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 애순과 관식의 서사는 개인의 사랑과 가족의 평화라는 틀 안에서만 출렁인다는 지적 또한 당시의 사회상을 떠올려 보자면 곱씹을 만한 지적이다.
그러나 [폭싹 속았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오롯이 머물며 각자의 방식대로 치열했던 이들을 선택한 작품이기도 하다. 어쩌면 인물들의 여러 순간들 중에서 그 사랑의 순간들만을 취사선택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시대사를 녹여낸 작품들이 갖는 무게는 대단하다. 역사의 아픔들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들이 걸작의 칭호를 받는 일은 마땅하다. 그러나 거친 바람을 맞는 모두의 대응이 하나일 리는 없을 것이다. 고된 삶을 살아냈던 이들이 선택한 것이 그저 사랑과 가족이었다는 것이 굳이 타자가 지적할 흠이 될 이유 또한 없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작품이 나를 울린 것은 작품 속 인물들의 내 삶의 순간들을 함께 펼쳐냈기 때문이다. 설레고 아프고 미안하고 안타까웠던 그렇게 사랑의 이음동의어가 아닐 리 없던 감정들의 이름을 함께 찾아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고맙다. 나를 각성 시키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형형한 불빛의 움직임을 동경하는 동시에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지만 어쩐지 사그라들지 않는 내 머리 위의 전등 또한 사무치게 고맙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기 때문이다.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서 임승유 시인의 시집 <생명력 전개>에 수록된 시 '크고 작은 애들'의 시구를 떠올렸다. '어둠을 끌어다가 담요처럼 덮어주었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어이 달라붙어 풍경이 되는 장면' 이라는. '장하다'라는 형용사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기상이나 인품이 훌륭하다'는 뜻이고 둘째는 '크고 성대하다'는 뜻이다. [폭싹 속았수다]는 '장하다'의 세 번째 뜻을 닮았다. '마음이 흐뭇하고 자랑스럽다' 라는 말. 누군가에게 '너무 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 삶을 평가하는 태도에서는 나올 수 없을 말임을 안다. 그 말은 곧 마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겠다는, 안고 등을 두드리겠다는,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내어주겠다는 약속일 것이다.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서 임승유 시인의 시집 <생명력 전개>에 수록된 시 '크고 작은 애들'의 시구를 떠올렸다. '어둠을 끌어다가 담요처럼 덮어주었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기어이 달라붙어 풍경이 되는 장면' 이라는. '장하다'라는 형용사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기상이나 인품이 훌륭하다'는 뜻이고 둘째는 '크고 성대하다'는 뜻이다. [폭싹 속았수다]는 '장하다'의 세 번째 뜻을 닮았다. '마음이 흐뭇하고 자랑스럽다' 라는 말. 누군가에게 '너무 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그 삶을 평가하는 태도에서는 나올 수 없을 말임을 안다. 그 말은 곧 마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겠다는, 안고 등을 두드리겠다는,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내어주겠다는 약속일 것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임상춘 작가가 쓰고 김원석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의 16부작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는 이 위험한 시대에 한숨처럼 뱉게 되는 허망한 질문들에 대한 간곡한 대답이다. 1960년대부터 202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을 제주와 부산, 서울이라는 공간을 넘나들며 펼쳐 놓은 [폭싹 속았수다]의 이야기는 고색창연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삶의 순환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이들, 사랑을 하고 어른이 되는 순간들, 좌절하고 고통받으면서도 끝끝내와 기어코를 지나 마침내로 향하는 여정이 펼쳐진다. 이야기의 축은 제주에서 나고 자란 요망진 반항아 오애순(아이유)과 팔불출 무쇠 양관식(박보검)의 사랑 이야기다. 애순을 수시로 찾아오는 가난과 불운이 그의 삶을 불행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칠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한 사람, 가족이 아니었지만 가족이 되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꿈 꿔보지 못한 삶의 끝을 만들게 해준 사람이 바로 관식이다. [폭싹 속았수다]는 엄마(광례,염혜란)라는 아랫목이 너무 일찍 차가워진 한 사람의 곁에 또 다른 아랫목인 나무 관식을 세우는 애틋한 로맨스 판타지인 동시에 가족이라는 집단의 힘을 긍정하는 휴먼 드라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 일이 생의 가장 큰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는 이 드라마가 지금 시대의 대중들에게 일정 부분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점은 분명하다. 작품을 이끌어가는 두 주인공 애순과 관식의 서사는 개인의 사랑과 가족의 평화라는 틀 안에서만 출렁인다는 지적 또한 당시의 사회상을 떠올려 보자면 곱씹을 만한 지적이다.
그러나 [폭싹 속았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오롯이 머물며 각자의 방식대로 치열했던 이들을 선택한 작품이기도 하다. 어쩌면 인물들의 여러 순간들 중에서 그 사랑의 순간들만을 취사선택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시대사를 녹여낸 작품들이 갖는 무게는 대단하다. 역사의 아픔들을 예술로 승화한 작품들이 걸작의 칭호를 받는 일은 마땅하다. 그러나 거친 바람을 맞는 모두의 대응이 하나일 리는 없을 것이다. 고된 삶을 살아냈던 이들이 선택한 것이 그저 사랑과 가족이었다는 것이 굳이 타자가 지적할 흠이 될 이유 또한 없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작품이 나를 울린 것은 작품 속 인물들의 내 삶의 순간들을 함께 펼쳐냈기 때문이다. 설레고 아프고 미안하고 안타까웠던 그렇게 사랑의 이음동의어가 아닐 리 없던 감정들의 이름을 함께 찾아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고맙다. 나를 각성 시키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형형한 불빛의 움직임을 동경하는 동시에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지만 어쩐지 사그라들지 않는 내 머리 위의 전등 또한 사무치게 고맙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기 때문이다.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전문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1

앞으론 내국인들 제주서 크루즈 타고 국제 여행 가능
- 2

[진선희의 백록담] 흩날리는 벚꽃 아래 다시 맞는 4월
- 3

제주 8·9급 공채 235명 선발에 1575명 지원.. 평균연령 30세
- 4

제주 대규모 야외세트장 조성 추진 '기대반 우려반'
- 5

제주 올해 첫번째 추경 편성… 2194억원 추가 투입
- 6

제주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삼진아웃제' 도입
- 7

농어촌민박 느는데 관련법 개정 추진 타격 우려
- 8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 공무원 54명 신규 채용
- 9

'1안타 빈공' 제주고 이마트배 고교야구 1회전 탈락
- 10

4월 첫 주 제주지방 꽃샘추위 물러가고 완연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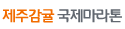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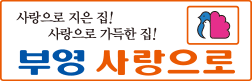






 2025.04.02(수) 06:43
2025.04.02(수) 0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