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의 하루를 시작하며] 장소의 기억, 기록될 이야기
- 입력 : 2025. 02.19(수) 05:0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한라일보] 대만을 여행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지나치는 곳이 있다. 공항에서 시내로, 그리고 주변 소도시로 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 타이베이 메인 역이다. 그곳에서 시먼딩 상업 지구로 이어지는 곳에, 지금은 사라진 '중화상창'이 있었다. 1961년부터 1992년 철거되기까지, 중화상창은 타이베이의 주요 상업 중심지로 대만 근현대사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이었다. 총 여덟 개의 3층 건물이 육교로 연결된 독특한 구조를 지닌 그곳은, 다양한 상점들과 함께 대만 사람들의 일상과 정서를 품으며 타이베이의 번성과 쇠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다.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힘들지만 문학과 예술 속에서 중화상창은 도시와 개인, 그리고 역사를 잇는 기억의 장소이자 근현대 과정에서 상실된 것들을 상징하는 주요 공간으로 여전히 살아 있다.
우밍이의 소설 '햇빛 어른거리는 길 위의 코끼리' 역시 중화상창을 배경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저문 시대의 질감을 신비롭게 풀어놓는다. 소설 속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는 마법처럼 시간의 경계를 지우고 현재를 반추하는 깊은 여운으로 다가왔다.
대만 여행 중,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중화상창과 닮은 장소를 우연히 마주했다. 활기는 없었으나, 육교로 연결된 건물들과 1층을 채운 상점들, 2층에 자리한 작은 사원,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는 주거 공간까지 묘한 친숙함을 자아냈다. 알고 보니 그곳은 타이베이에 마지막으로 남은 중화상창 구조의 건축물이었다. 몇몇 대만 사람들이 사라진 공간을 기억하고 현재를 기록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물리적 공간이 인간과 연결될 때, 그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정서적·역사적·사회적 의미가 축적된 고유한 '장소'가 된다.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다"(에드워드 렐프)라는 말처럼, 장소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철거나 재개발, 전쟁과 같은 이유로 장소가 사라질 때, 우리는 피상적인 공간을 잃는 것을 넘어 한 시절이 소멸하는 상실감을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라진 장소는 이야기를 통해 되살아나 기억 투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상징적 의미를 품은 장소로서, 삶과 함께 지속된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잔인하게 마주해야 하는 요즘, 뉴스 속 광주 금남로의 양극화된 시위 현장을 바라보다가 다큐멘터리와 사진 속에서 봤던 과거의 금남로가 날카롭게 스쳐 갔다. 1980년 이후, 금남로 역시 외형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그곳은 여전히 '민주화'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총탄이 지나간 거리, 피로 물든 아스팔트 위에서 울려 퍼졌던 외침은 사라졌으나, 그날의 이야기는 지금도 선연하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여린 꽃이 언 땅을 밀어내고 피어나는 계절, 우리의 봄도 부디 곱게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는 겨울 끝이다. <김연 시인>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우밍이의 소설 '햇빛 어른거리는 길 위의 코끼리' 역시 중화상창을 배경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저문 시대의 질감을 신비롭게 풀어놓는다. 소설 속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는 마법처럼 시간의 경계를 지우고 현재를 반추하는 깊은 여운으로 다가왔다.
대만 여행 중,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중화상창과 닮은 장소를 우연히 마주했다. 활기는 없었으나, 육교로 연결된 건물들과 1층을 채운 상점들, 2층에 자리한 작은 사원,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는 주거 공간까지 묘한 친숙함을 자아냈다. 알고 보니 그곳은 타이베이에 마지막으로 남은 중화상창 구조의 건축물이었다. 몇몇 대만 사람들이 사라진 공간을 기억하고 현재를 기록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물리적 공간이 인간과 연결될 때, 그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정서적·역사적·사회적 의미가 축적된 고유한 '장소'가 된다. "인간답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다"(에드워드 렐프)라는 말처럼, 장소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렇기에 철거나 재개발, 전쟁과 같은 이유로 장소가 사라질 때, 우리는 피상적인 공간을 잃는 것을 넘어 한 시절이 소멸하는 상실감을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라진 장소는 이야기를 통해 되살아나 기억 투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상징적 의미를 품은 장소로서, 삶과 함께 지속된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잔인하게 마주해야 하는 요즘, 뉴스 속 광주 금남로의 양극화된 시위 현장을 바라보다가 다큐멘터리와 사진 속에서 봤던 과거의 금남로가 날카롭게 스쳐 갔다. 1980년 이후, 금남로 역시 외형은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그곳은 여전히 '민주화'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총탄이 지나간 거리, 피로 물든 아스팔트 위에서 울려 퍼졌던 외침은 사라졌으나, 그날의 이야기는 지금도 선연하다.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여린 꽃이 언 땅을 밀어내고 피어나는 계절, 우리의 봄도 부디 곱게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는 겨울 끝이다. <김연 시인>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6:00

[고영림의 현장시선] 프랑스의 옹플뢰르 그리고 …
- 00:00

[열린마당] 도민과 함께 하는 도시숲 조성·관리
- 01:00

[이호진의 목요담론] '주거안정 월세대출' 활용…
- 00:30

[열린마당] 숲길 탐방 시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
- 00:00

[열린마당] 제주농업의 새로운 기회, 가치형 농…
- 03:00

[유동형의 한라시론] 돈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
- 06:00

[열린마당] 화목 보일러 화재 예방, 올바른 사용…
- 05:00

[김연의 하루를 시작하며] 장소의 기억, 기록될 …
- 03:00

[열린마당]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굉음과 곡…
- 02:00

[이길수의 건강&생활] 손등 정맥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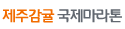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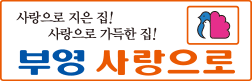






 2025.02.21(금) 17:28
2025.02.21(금)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