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5] 3부 오름- (84) 느지리오름, 낮은 오름
저지오름, 높고 평평한 오름이란 해독은 성급한 오판
- 입력 : 2025. 04.22(화) 00:4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느지리’는 과연?
[한라일보] 느지리오름은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있다. 1577~1578년 임제(林悌)가 제주를 여행하며 저술한 남명소승에 만조리연대(晩早里煙臺)로 나오고, 이증이 1679년 제주에 파견된 기간 보고 들은 것을 일기체로 기록한 남사일록에 만조봉수(晩早烽燧)로 표기했다. 18세기 후반 제주읍지에 만주봉수(晩注烽燧), 1899 제주군읍지에 만조봉(晩照烽)으로 나온다. 지역에서는 느지리오름으로 부른다.
 지금까지 고전에서 표기한 이 오름의 지명은 여럿이다. 우선 만리봉수(晩里烽燧)의 만리(晩里)가 있다. 만조리연대(晩早里煙臺)의 만조리(晩早里)라는 지명도 있다. 만조망(晩早望), 만조봉(晩早烽), 만조봉수(晩早烽燧), 만조악(晩早岳)이라는 지명도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만조(晩早)는 사용 빈도가 아주 높다. 만조봉(晩照烽)과 만조산(晩照山)으로 나오는 만조(晩照)가 또 한 종류의 지명이다. 만주봉수(晩注烽燧)는 드물게 나오지만 역시 이질적인 지명이다. 조리연대(早里煙臺)라는 지명도 나온다. 이 지명들은 만리(晩里), 만조리(晩早里), 만조(晩早), 만조(晩照) 등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전에서 표기한 이 오름의 지명은 여럿이다. 우선 만리봉수(晩里烽燧)의 만리(晩里)가 있다. 만조리연대(晩早里煙臺)의 만조리(晩早里)라는 지명도 있다. 만조망(晩早望), 만조봉(晩早烽), 만조봉수(晩早烽燧), 만조악(晩早岳)이라는 지명도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만조(晩早)는 사용 빈도가 아주 높다. 만조봉(晩照烽)과 만조산(晩照山)으로 나오는 만조(晩照)가 또 한 종류의 지명이다. 만주봉수(晩注烽燧)는 드물게 나오지만 역시 이질적인 지명이다. 조리연대(早里煙臺)라는 지명도 나온다. 이 지명들은 만리(晩里), 만조리(晩早里), 만조(晩早), 만조(晩照) 등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지명해독에는 기록상 거의 모든 지명에 나오는 한자 '만(晩)'이 핵심어다. 이 글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는 '① 늦다, ② (해가) 저물다, ③ 늙다, 쇠하다(衰--)'로 나온다. 이 세 가지 풀이 중 지명에 적용할 만한 내용으로는 ①과 ②일 것이다. 이어지는 글자로 새벽, 이른 아침, 이르다 등을 뜻하는 '조(早)', 비추다, 비치다, 햇빛을 뜻하는 '조(照)' 등을 쓴 것으로 볼 때도 옛 기록자들은 늦다, (해가) 저물다 등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늦’의 고어는 ‘’
1527년 훈몽자회에는 '만(晩)'을 '느즐 만'이라 했다. 1576년 신증유합, 1583년 석봉천자문, 18세기말 왜어유해에도 같다. 지역에서는 이 오름을 '느지리오름'이라고 한다. '느지리'는 '느즈리'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음이다. 그러므로 '만(晩)'이라는 한자를 동원한 것은 '느즐 만'의 훈 부분 '느즐'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음을 알게 된다. '느즐'의 어간은 '느즈'일 것이다. 폐음절로 발음하면 '늦'일 수도 있다. 오늘날 '느지리'로 발음하는 걸 보면 16세기 초반 훈몽자회가 만들어질 당시와 거의 같게 부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만리봉수(晩里烽燧)의 만리(晩里), 만조리연대(晩早里煙臺)의 만조리(晩早里)라는 지명도 '느즈+리'의 구조이므로 '만(晩)'이라는 글자 하나만을 쓴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즉, 여기서 '리(里)'나 '조리(早里)'는 '느지리'의 '리'와 '지리'를 중첩해서 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조(晩照)의 '조' 역시 '느지'의 '지'를 표기한 것이다.
만리봉수(晩里烽燧)의 만리(晩里), 만조리연대(晩早里煙臺)의 만조리(晩早里)라는 지명도 '느즈+리'의 구조이므로 '만(晩)'이라는 글자 하나만을 쓴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즉, 여기서 '리(里)'나 '조리(早里)'는 '느지리'의 '리'와 '지리'를 중첩해서 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조(晩照)의 '조' 역시 '느지'의 '지'를 표기한 것이다.
문제는 '느즐'의 어간 '느즈'의 정체다. 이 말은 점차 폐음절화하면서 '늦'이 됐다. 비(卑)라는 한자는 오늘날 '낮을 비'라고 하고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1576년, 신증유합, 1583년 석봉천자문에는 '나잘비'로 표기했다.
'저(低)'라는 글자도 오늘날은 '밑 저'라 하지만 신증유합에는 '나잘 뎌'라 표기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1459년 월인석보 등에도 이미 '나자기'라는 훈민정음 표기가 나오는 등 여러 고전에서 '낮'을 '나자'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나'라는 발음은 세월이 흐르면서 '느'로 변해 오늘날 '느지리'가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자' 혹은 '나즈'를 '작고 낮다'라는 뜻으로 쓰는 언어로는 퉁구스어권의 올차어, 오로크어, 나나이어, 오로첸어, 우데게어, 솔론어 등 북방 여러 언어가 있다.
이 '느지리'란 '낮은 오름'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오름을 지시할 때 '~오름'이라고 후부 요소를 붙이는 습관은 현대적 개념이 개입한 것이지 사실 제주어에서는 낮으면 '낮은 것', 높으면 '높은 것' 정도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느지리'라는 말 자체에 '낮은 오름'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닥마루’의 ‘닥’은 ‘높은’의 뜻
이 오름 지명 '느지리'가 '낮은' 오름이라는 의미인 것은 가까이에 있는 저지오름의 지명으로 더욱 선명해진다.
본 기획 123회에 "'저지(楮旨)'라는 지명은 1709년 탐라지도병서라는 문헌에 처음 나타난다. 이 지명은 '당마르'라는 현지인들의 발음을 '닥마르'라는 발음으로 이해해 차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지오름은 닥나무라는 뜻과는 무관하며, 위가 평평한 오름이라는 뜻"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조급하게 판단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여기서 필자의 견해를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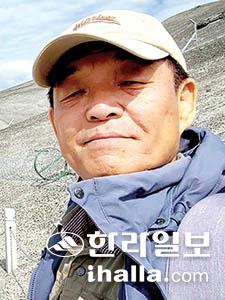 현지인들은 '당마르'라고 발음한 것이 아니라 '닥마르'라고 발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음을 반영해 '저지오름(楮旨~)'이라 한 것이다. 그 뜻은 '높은 마르오름'이라는 뜻이다.
현지인들은 '당마르'라고 발음한 것이 아니라 '닥마르'라고 발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음을 반영해 '저지오름(楮旨~)'이라 한 것이다. 그 뜻은 '높은 마르오름'이라는 뜻이다.
'닥'이란 물론 '닥나무'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돌궐어에서 기원한 말로 '높은' 혹은 '산'이라는 뜻을 갖는다. 돌궐어권의 카라카니드어, 투르크메니스탄어, 살라어, 칼라즈어, 투르크 고어, 위구르어 등 거의 모든 언어에서 공통으로 쓴다.
여기서 기원한 '닥'이라는 말을 기록자들이 차자하면서 '닥 저(楮)'의 훈가자 '닥'을 나타내려고 동원한 한자가 '저(楮)'다. 다만 '명이동(明理洞)'의 '명이'는 '마르' 가까이 있는 마을의 한자 차용 표기다. 본 기획 어도오름 편에 나오듯이 어음리의 하동을 '부멘이' 혹은 '비멘이'의 '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느지리오름은 낮은 오름이라는 뜻이다. 가까운 저지오름에 비해 낮다는 뜻이다. 저지오름과 느지리오름은 대비지명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한라일보] 느지리오름은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있다. 1577~1578년 임제(林悌)가 제주를 여행하며 저술한 남명소승에 만조리연대(晩早里煙臺)로 나오고, 이증이 1679년 제주에 파견된 기간 보고 들은 것을 일기체로 기록한 남사일록에 만조봉수(晩早烽燧)로 표기했다. 18세기 후반 제주읍지에 만주봉수(晩注烽燧), 1899 제주군읍지에 만조봉(晩照烽)으로 나온다. 지역에서는 느지리오름으로 부른다.

이 지명해독에는 기록상 거의 모든 지명에 나오는 한자 '만(晩)'이 핵심어다. 이 글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쉽게 풀릴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는 '① 늦다, ② (해가) 저물다, ③ 늙다, 쇠하다(衰--)'로 나온다. 이 세 가지 풀이 중 지명에 적용할 만한 내용으로는 ①과 ②일 것이다. 이어지는 글자로 새벽, 이른 아침, 이르다 등을 뜻하는 '조(早)', 비추다, 비치다, 햇빛을 뜻하는 '조(照)' 등을 쓴 것으로 볼 때도 옛 기록자들은 늦다, (해가) 저물다 등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늦’의 고어는 ‘’
1527년 훈몽자회에는 '만(晩)'을 '느즐 만'이라 했다. 1576년 신증유합, 1583년 석봉천자문, 18세기말 왜어유해에도 같다. 지역에서는 이 오름을 '느지리오름'이라고 한다. '느지리'는 '느즈리'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음이다. 그러므로 '만(晩)'이라는 한자를 동원한 것은 '느즐 만'의 훈 부분 '느즐'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음을 알게 된다. '느즐'의 어간은 '느즈'일 것이다. 폐음절로 발음하면 '늦'일 수도 있다. 오늘날 '느지리'로 발음하는 걸 보면 16세기 초반 훈몽자회가 만들어질 당시와 거의 같게 부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느즐'의 어간 '느즈'의 정체다. 이 말은 점차 폐음절화하면서 '늦'이 됐다. 비(卑)라는 한자는 오늘날 '낮을 비'라고 하고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1576년, 신증유합, 1583년 석봉천자문에는 '나잘비'로 표기했다.
'저(低)'라는 글자도 오늘날은 '밑 저'라 하지만 신증유합에는 '나잘 뎌'라 표기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1459년 월인석보 등에도 이미 '나자기'라는 훈민정음 표기가 나오는 등 여러 고전에서 '낮'을 '나자'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나'라는 발음은 세월이 흐르면서 '느'로 변해 오늘날 '느지리'가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나자' 혹은 '나즈'를 '작고 낮다'라는 뜻으로 쓰는 언어로는 퉁구스어권의 올차어, 오로크어, 나나이어, 오로첸어, 우데게어, 솔론어 등 북방 여러 언어가 있다.
이 '느지리'란 '낮은 오름'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오름을 지시할 때 '~오름'이라고 후부 요소를 붙이는 습관은 현대적 개념이 개입한 것이지 사실 제주어에서는 낮으면 '낮은 것', 높으면 '높은 것' 정도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느지리'라는 말 자체에 '낮은 오름'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닥마루’의 ‘닥’은 ‘높은’의 뜻
이 오름 지명 '느지리'가 '낮은' 오름이라는 의미인 것은 가까이에 있는 저지오름의 지명으로 더욱 선명해진다.
본 기획 123회에 "'저지(楮旨)'라는 지명은 1709년 탐라지도병서라는 문헌에 처음 나타난다. 이 지명은 '당마르'라는 현지인들의 발음을 '닥마르'라는 발음으로 이해해 차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지오름은 닥나무라는 뜻과는 무관하며, 위가 평평한 오름이라는 뜻"이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변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조급하게 판단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여기서 필자의 견해를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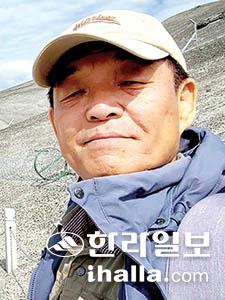
'닥'이란 물론 '닥나무'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은 돌궐어에서 기원한 말로 '높은' 혹은 '산'이라는 뜻을 갖는다. 돌궐어권의 카라카니드어, 투르크메니스탄어, 살라어, 칼라즈어, 투르크 고어, 위구르어 등 거의 모든 언어에서 공통으로 쓴다.
여기서 기원한 '닥'이라는 말을 기록자들이 차자하면서 '닥 저(楮)'의 훈가자 '닥'을 나타내려고 동원한 한자가 '저(楮)'다. 다만 '명이동(明理洞)'의 '명이'는 '마르' 가까이 있는 마을의 한자 차용 표기다. 본 기획 어도오름 편에 나오듯이 어음리의 하동을 '부멘이' 혹은 '비멘이'의 '멘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느지리오름은 낮은 오름이라는 뜻이다. 가까운 저지오름에 비해 낮다는 뜻이다. 저지오름과 느지리오름은 대비지명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기획특집
- 00:4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5] 3부 오름- (84) 느…
- 00: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4] 3부 오름-(83) 당…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3] 3부 오름-(82) 저…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2] 3부 오름-(81)모…
- 03:2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1] 3부 오름-(80)어…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0] 3부 오름-(79)고…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9] 3부 오름-(78)금…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8] 3부 오름-(77)각…
- 03:4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7] 3부 오름-(76) 단…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6] 3부 오름-(75)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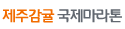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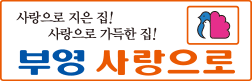






 2025.04.27(일) 00:23
2025.04.27(일) 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