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 2025. 02.04(화) 03:00
-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한라일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304번지. 표고 100.4m, 자체 높이 50m다. 세종실록에 농목악(弄木岳), 17세기 말 탐라도, 1703년 탐라순력도, 1709년 탐라지도, 18세기 초반 대정현지도, 18세기 중반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용목악(龍木岳)으로 나온다, 이후 여러 자료에 농남봉(農南峰)으로 표기했다. 지역에서는 장목악(樟木岳), 녹남악(鹿南岳)으로도 쓰고, 1965년 제주도에는 농남미오름,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 녹남봉, 디지털문화대전에 녹남오름으로 표기했다. 이 지명은 흔히 녹나무가 있어서라거나 녹나무숲이 무성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녹남오름 인근의 저류지, 오름 주변 곳곳에 못이 있으며, 동측에 신도저수지와 저류지가 조성되어 있다. 김찬수
어형의 유사성에 이끌린 해석
이 '녹남' 혹은 '농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해석은 모두 '녹나무'를 지시하는 발음을 훈차한 것으로 보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농목악(弄木岳)의 '농'은 '녹'을 음가자로 표기한 것이고, '목'은 나무의 제주어 '남' 혹은 '낭'의 훈독자 즉, '녹남' 혹은 '농낭'은 녹나무를 지시하는 제주어를 나타낸다고 한다. 녹나무가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인 지명이라는 설명이다. 녹남(綠楠), 녹남(鹿南), 농남(農南) 등도 모두 녹나무의 제주어 '녹낭'를 나타내려고 쓴 음독자로 보았다. 장목악(樟木岳)의 '장(樟)'은 '녹나무 장'이므로 훈독자로 차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오름에는 현재 녹나무가 자생하지 않는다. 왜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을 하는 것일까? 이런 주장의 내면을 보면 과거에는 녹나무가 많았었는데, 4·3사건 때 베어지거나 불타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고 한다.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녹나무가 있었다는 것일까? 그에 대한 기록이나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지명에 붙을 정도라면 장기간, 유별나게 이 오름에 녹나무가 있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런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녹나무가 지명에 반영할 만큼 쓰임새나 상징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현재 녹나무 자생지 어느 곳도 녹나무를 지명에 반영한 예도 없다.

자체 높이 140m의 차귀오름에서 바라본 녹남오름, 녹남오름은 자체 높이 50m로 차귀오름에 비해 훨씬 낮다. 김찬수
'녹’은 백록담의 ‘록’과 같은 기원
그렇다면 '녹남' 혹은 '농남'이라는 지명에는 다른 뜻이 있을까? 여기에 현장 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 오름 주변에는 유난히 물(못)이 많다. 북쪽에도 큰 못이 두 개가 있고, 북동쪽에는 개울처럼 길게 도랑 같은 지형이 있다. 동쪽 무릉도원로 옆에는 큰 호수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대정 재해8저류지와 신도저수지이다. 집중호우 시 인접 지역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만들었다. 2012년도에 준공한 이 호수는 표지판 기준으로 1만6310㎡인데, 현재 수면 면적은 1만2000㎡ 정도다. 이 호수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곳은 늘 물이 고여 있던 자연 못이었다. 당시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면적 약 1000㎡ 정도였다. 제주도에서 이 정도라면 아주 넓은 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변 상황으로 볼 때 녹남오름의 '녹'이란 백록담의 '록', 노루샘의 '노루'에서 보는 것처럼 호수를 말하는 것이다. 북방어에서 기원한다. 특히 몽골어계에서 '노올' '노루', '노르', '노오르', '누우르', '누루' 등 다양하게 분화했다. 이에 관해서는 본 기획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녹남오름의 '남'은 '낮은'의 뜻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전국에 '남산'이란 이름을 가진 산은 101개에 달한다. 산 이름으로는 가장 많다. 이 산들은 남쪽에 있어서 붙은 이름이 아니다. 물론 그중 남쪽이라는 뜻을 가진 산도 있을 것이다. 이 산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지 특별한 방위가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 '낮은 산'을 지시한다. 순천의 남산은 순천 시가지의 서쪽에 있다, 전북 임피면의 남산은 면 소재지에서 보나 남산마을에서 보나 서북쪽에 있다.
녹남오름을 '녹나무가 있는 오름'이라는 데서 붙은 이름이라는 해석은 전형적인 어형의 유사성에 이끌린 해석일 뿐이다. 남산을 남쪽에 있는 산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다. 백록담을 흰 사슴이 물을 먹은 못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녹남오름은 못이 있는 낮은 오름이라는 데서 붙은 지명이다.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1

제주서 SUV 도로 아래 추락... 여성 2명 병원 이송
- 2

제주 순대 6조각 2만5천원 논란에… 바가지 신고센터 운영
- 3

제주 4·3추념식에 국민의힘 지도부 또 불참
- 4

[허수호의 하루를 시작하며] 교실 CCTV 설치, 신뢰의 회복인가…
- 5
[사설] 학교 안전 위협하는 부실한 교육행정
- 6

[강준혁의 건강&생활] 피부 알레르기에 한의약적인 접근
- 7

제주도민안전보험 개편… 보장 금액 한도 최고 1000만원
- 8

JIBS제주방송노조 "폭행·욕설 정진홍 사장 사퇴하라"
- 9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앞둔 제주사회 긴장 고조
- 10

80대 고사리 채취객 실종 20여 분만에 구조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2] 3부 오름-(81)모…
- 03:2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1] 3부 오름-(80)어…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20] 3부 오름-(79)고…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9] 3부 오름-(78)금…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8] 3부 오름-(77)각…
- 03:4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7] 3부 오름-(76) 단…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6] 3부 오름-(75)남…
- 02: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5] 3부 오름-(74)돈…
- 03: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4] 3부 오름-(73)녹…
- 04:00

[제주도, 언어의 갈라파고스 113] 3부 오름-(7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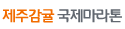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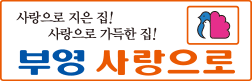






 2025.04.03(목) 20:10
2025.04.03(목) 20:10




























